한국 술은 무엇인가? 무엇을 한국 술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국 사람이 빚으면 한국 술인가? 한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빚으면 한국 술인가? 막걸리와 소주가 전부였던 과거에 비해, 많은 술들이 국내에서 생산•소비되고 있는 작금에는 무엇이 한국 술인가를 고민하게 만든다. 국산와인도 많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제맥주도 정말 다양하고, 막걸리와 청주, 소주를 생산하는 신생 양조장들도 많아졌다. 불과 10년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야말로 한국술의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정도이다. 막혔던 봇물이 터져나오는 듯하다. 과거 조선시대에 양반집에서 빚었던 술의 종류만 해도 2,000가지가 넘을 정도라고 하니, 그 모습이 다시 재현되는 듯하다. ‘술에 죽고 술에 사는 민족’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 술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새삼스레 한국 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한국 술인가’를 굳이 찾으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맛있으면 상관없지 않은가? 그렇다. 맛있으면 상관없다. 그렇지만 좀 알고는 먹어야 하지 않을까? 2,000년 넘게 우리 조상들이 먹어왔던 술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들의 유전자속에는 그 술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 남아 있을텐데... 그리고 그 술들이 단지 과거의 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먹어도, 맛있고 향기로워서 진짜 진짜 자랑하고 싶은데. 한국 술은 과거, 현재, 미래의 술이다. 한국 술은 선조들이 남겨준 유산 중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 중 하나다. 서구의 화려하고 거대한 건축물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별로 없지만, 우리 선조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많은 것을 유산으로 남겨놓았다. 그것이 오늘날 K-pop, K-food 등 K-culture로 되살아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술도 그 중의 하나다.
그럼 한국 술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전통주, 민속주, 농주, 토속주 등 우리 술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많다. 어떻든 현행 법률(전통주 등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전통주’라고 표기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전통주란 ‘중요무형문화재나 식품명인이 빚은 술이나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가 우리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빚은 술’을 말한다. 후자의 전통주를 ‘지역특산주’라고도 한다. 이전의 민속주니 농주니 하는 용어들은 사라지고 ‘지역특산주’로 통일된 것이다.

그런데 법률상 지역특산주의 범위에는 맥주나 와인, 위스키, 브랜디도 포함될 수 있다. 즉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가 홉과 보리를 재배해서 맥주를 만들면 지역특산주, 즉 전통주가 되고, 포도를 재배해서 와인을 만들어도 전통주가 된다. 그리고 그 맥주와 와인을 증류한 위스키, 브랜디도 전통주가 된다. 우리가 수수를 재배해서 고량주를 만들면 그것도 한국의 전통주가 된다. 이는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까?
전통주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문화적 관점과 산업적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문화적 관점에서 전통주를 바라보면 ‘전통’이라는 부분이 강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위에서 열거한 맥주, 와인, 위스키, 브랜디, 고량주 등은 전통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전통’보다는 ‘술’이라는 부분이 강조될 수 있다. 즉 산업적 관점에서 ‘전통’이 산업에 기여하는 측면보다 ‘술’이 산업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 많게 되면 ‘전통’은 ‘술’의 부속물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전통주는 농업이라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가 된다. 즉 전통주는 남아도는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처에 불과한 것이다. 어떤 농산물이든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산되기만 하면, 그것을 이용해 만드는 술은 ‘전통주’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술은 자칫 농업정책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 과거 과도하게 수입된 밀의 소비를 위해 쌀막걸리 제조를 금지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문화적 관점과 산업적 관점이 조화될 수는 없을까? 즉 ‘전통’으로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 전에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통주’는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자.
개념상 ‘전통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술, 즉 옛날부터 내려오는 원료, 방식, 도구를 이용하여 빚은 술을 의미한다. 여기서 ‘옛날’은 적어도 우리 가양주를 말살했던 일제강점기 이전의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걸친 시기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때의 술빚는 ‘원료’는 전분질원료와 누룩, 물이다. 술빚는 ‘방식’은 병행복발효(와인은 단발효, 맥주는 단행복발효)방식이다. 술빚는 ‘용기’는 흙으로 만든 옹기이다. 그런데 술빚는 ‘방식’과 ‘용기’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전통주를 개념짓기란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원료, 즉 전분질원료와 누룩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통주의 본질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분질원료에는 쌀, 보리와 같은 곡류가 있고, 감자, 고구마와 같은 서류가 있다. 지금의 쌀 등이 옛날의 그것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옛날 쌀을 그대로 재현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라, 전통주라고 해서 옛날과 똑같은 쌀로 빚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개념 본질상 전통주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술로서, 전분질원료와 누룩을 이용하여 빚은 술’이 될 것이다. 누룩에는 쌀 등의 전분질을 맛과 향을 가진 알코올로 변환시키는 비밀이 숨어있다. 그 비밀은 바로 발효미생물이다. 누룩곰팡이, 효모, 젖산균 등이 대표적인 발효미생물이다.
첫째, 누룩곰팡이는 효소를 생성하여 전분을 포도당으로 잘게 잘게 쪼갠다. 둘째, 효모는 그 포도당을 알코올로 분해한다. 셋째, 젖산균은 외부의 균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술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누룩에는 이러한 미생물외에도 단백질, 지방과 각종 무기질이 있다. 효소나 효모의 종류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술의 맛과 향을 가져온다.
한국 누룩에 있는 발효미생물의 특징은, 자연균이며 복합균이라는 점이다. 인공적으로 조작해서 배양된 균이 아니라 자연상태의 균을 단지 누룩을 띄워 번식시킨 것에 불과하다. 일본 청주(사케)에 사용되는 누룩곰팡이는 주로 백곡균인데, 이 백곡균은 자연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배양균이다. 흑곡균의 변이체를 만들어 술에 사용한 것이 백곡균이다. 한국 누룩에 있는 누룩곰팡이는 자연상태의 황곡균이어서, 그 누룩으로 술을 빚게 되면 색깔이 누런 황금색이 나온다. 일본 청주는 백곡균으로 빚기 때문에 술 색깔이 투명하다. 한국의 백화수복, 청하 등도 일본 청주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백곡균으로 빚기 때문에 색깔이 투명하다.

현재 한국의 막걸리는 누룩막걸리, 입국막걸리, 효소막걸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누룩막걸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연균 상태의 발효미생물에 여러 유기물과 무기질이 혼합된 누룩으로 빚는 막걸리이다. ‘입국막걸리’는 누룩으로부터 균만 추출한 후 이를 인공적으로 조작∙배양하여 빚는 막걸리이다. 인공적으로 조작∙배양한 균이 바로 앞서 본 백곡균인 것이다. 입국막걸리와 일본 청주(사케)에 사용되는 균이 동일한 것이다.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막걸리는 자연누룩이 아닌 배양된 균을 이용하여 빚는 입국막걸리로, 이는 일제강점기 이후 도입된 방식이다. 또한 이런 막걸리들은 아스파탐 등의 인공감미료를 대부분 첨가하고 있다.
배양된 균을 사용하거나 인공 감미료를 첨가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전통주’라고 말할 때의 술맛은 이천년을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술맛, 그것은 자연누룩을 이용해 빚은 무감미료의 술맛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한국의 맛인 것이다.
다음에 ‘효소막걸리’는 술균으로부터 효소만 추출해서 빚는 막걸리이다. 효소막걸리는 균(곰팡이) 자체가 아예 없다. 입국막걸리는 비록 조작∙배양된 것이긴 하지만 균으로 빚는 술인데 반해, 효소 막걸리는 균조차 없는 것이다. 최근의 막걸리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누룩막걸리에서 입국막걸리, 효소막걸리로 갈수록 인공적 요소가 점점 가미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포장라벨에 보면, 누룩막걸리는 성분표시란에 ‘정제수, 누룩, 쌀’로 표기되어 있고, 입국막걸리는 ‘정제수, 입국(또는 국), 효모’로 표기되어 있으며, 효소막걸리는 ‘정제수, 정제효소, 효모’로 표기되어 있다.

2,000년 넘게 우리 조상들이 먹어왔던 술의 정체는 바로 ‘누룩’으로 빚은 술이다. 최대한 자연상태 그대로 술을 빚은 것이다. 물론 서양에 비해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 그랬던 측면도 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오늘날 서양에서는 natural 와인, 람빅(Lambic) 맥주 등 자연의 균을 이용한 술에 대해 그 가치를 인정하고 몇 배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누룩으로 빚은 술이 단지 자연의 균을 이용했다는 점에서만 장점이 있는 게 아니다. 바로 맛있고 향기롭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수많은 명주들이 누룩으로 빚은 술들이다. 고급스럽고 다양하기 그지없다. 나아가 밤새 먹어도 숙취가 없다. 그러니 우리의 전통주를 한번 먹어본 사람은 이러한 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록 누룩으로 빚는 전통주가 본격적으로 복원된 지 10년이 조금 넘었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술이 등장하리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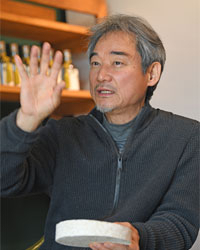
글=정회철 전통주조 예술대표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