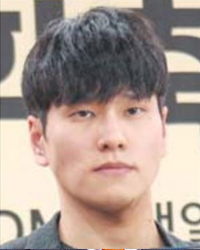
경계의 땅을 함께 바라봐 주신 심사위원님과 독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저는 선을 긋는 대신, 선들 사이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들을 오래 듣고자 했다. 물 아래 가라앉은 교실의 종, 얼어붙은 하천 위에 남은 두루미의 발자국, 동전 하나로 켜지는 망원경의 초점, 서랍 속에 눕혀진 쇳조각의 체취, 출입 금지의 표지 뒤에서 싹을 밀어 올리는 뿌리, 낮은 갱도 벽에 남은 손등의 홈.... 이 작품들은 그런 떨림의 목록이다. DMZ는 ‘비무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무거운 장비와 사연이 겹겹이 놓인 자리였다. 거기서 시가 할 일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영웅담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버려진 각도와 간격, 수치와 도면의 틈에 스며 있는 호흡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믿었다. 장갑에서 떨어진 씨앗이 검은 토양을 밀어 올리고, 철책의 음영이 바람 한 번에 풀리고, 물안개가 절벽의 상처를 덮을 때, 저는 언어의 앞뒤를 재단하기보다 현의 잔향을 따라갔다.
기록이 빠진 연표의 빈칸을 소리로 메우듯, 보지 못했던 운동장을 초점으로 다시 불러오듯, 시는 망실된 것을 ‘되돌려놓는’ 장치라기보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방향을 가늠하는 간이 수위표였다. 이 상은 제 것이기보다, 파로호의 물결을 건너간 아이들, 눈발 속에서 방향을 접었다 펴던 새들, 동전통을 비우던 관리인, 녹을 문지르던 이름 없는 손, 현장의 연구자와 병사, 그리고 그 가장자리를 살아내는 주민들에게 드린다. 저는 앞으로도 선명한 구호 대신, 낮은 울림과 작은 떨림을 더 오래 듣겠다. 종이 물속에서 울리지 못할 때도, 기포처럼 올라오는 신호를 외면하지 않겠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칸을 비워두고, 서로의 선이 겹쳐지는 높이에서 잠시 멈출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