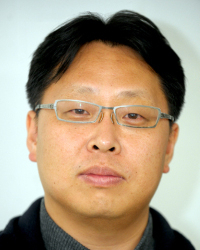
수학에는 무리수라는 특별한 숫자가 있다. 무리수는 소수점 아래 숫자가 끝없이 이어지면서도 반복되지 않는 수다. 대표적으로 ‘루트 2(√2)’나 ‘원주율(π·파이)’ 등이 있다. 이들은 자로 정확히 잴 수도, 분수로 딱 떨어지게 표현할 수도 없다. 인간이 만든 어떤 도구로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이 수들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정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다.
정치는 계산의 예술이라고들 말한다. 표 계산과 여론조사, 이해관계, 협상 등 이 모든 것이 숫자와 논리로 설명되는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정치의 세계는 무리수처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한쪽에서는 타협을 부르짖고, 다른 한쪽에서는 야합이 횡행한다. ‘정의’는 외면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국민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혼란스럽다. 마치 소수점 아래 끝없이 이어지는 무리수처럼 명확한 답 없이 상황만 계속 흘러가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정치를 보면 이런 느낌은 더욱 강해진다. 여야는 사사건건 대립하고, 협치보다는 감정이 앞선 대화가 이어진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새로운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국민의 삶보다는 정쟁의 소용돌이가 뉴스의 중심이 된다. 한 번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는 무리수처럼, 정치는 늘 새로운 갈등과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분열과 반목은 마치 원주율의 숙명처럼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끝없이 이어진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순한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복잡함’을 이해하고 조정할 줄 아는 정치인의 안목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리수는 아무리 복잡해도 수학자들이 그것을 풀어내고 분석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것 처럼, 정치인들도 불확실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책임 있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정치권 인사들은 무리수를 풀기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라 무리수를 던지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복잡함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에게 모든 탓을 떠넘기는 뻔뻔함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물론 반성은 없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 이후로 ‘예측 불가능성’ 이라는 무리수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됐다. 원칙은 필요에 따라 바뀌는 것이 되어 버렸다.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 주말 목도한 코미디 같은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이 전형적이다. 이같이 정치가 무리수처럼 끝없이 흘러가면서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구조를 더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무리수는 수학자에게 도전의 대상이지만, 정치에서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고통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현실의 문제는 대단한 이념이나 계파의 이익 같은 복잡한 수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집 밥상의 반찬이고 내일 입금해야 할 자취방 월세라는 것을 말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위협하는, 더 재밌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럴수록 국민의 삶은 점점 피곤해지고, 무력감만 깊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는 더 이상 문제를 푸는 기능은 상실한 채, 문제 그 자체로 수렴돼 버렸다. 더이상 정치를 무리수의 굴레 속으로 몰아 넣을 수는 없다. 해결책이 복잡할 수 있지만, 책임과 방향을 잃어서도 안 된다. 국민들은 빠른 해답보다, 최소한의 원칙과 방향을 보여주는 정치, 반복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스스로 무리수를 풀어내려고 하는 정치인의 노력을 원할 뿐이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사이 국민이 정치를 보며 한걱정을 하고, 쓴웃음을 짓는 것도 모자라 창피함도 감내해야 하는 상황들은 이제 끊어내야 한다. 정치와 코미디의 흐려지는 경계를 명확히 다잡아야 한다. 코미디는‘개그 콘서트’나 ‘SNL 코리아’로도 충분하니, 섣불리 나라를 다스리는 일인 정치(政治)를 하려고 들지 말고, 올바름에 이르게 하는 정치(正致)를 먼저 해보시라 조언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