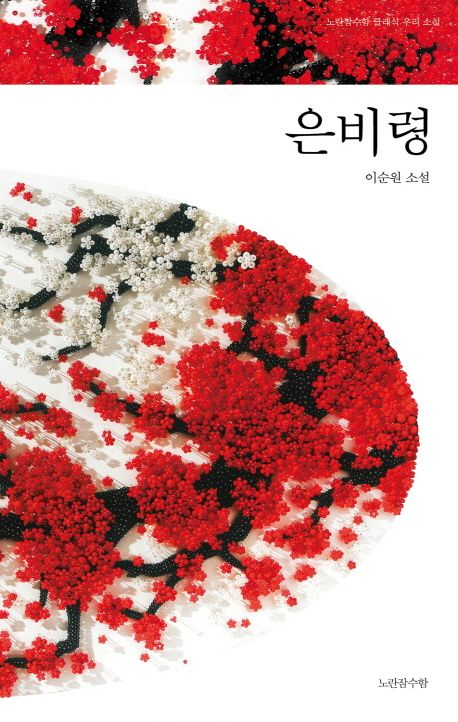
내가 읽은 소설 속 ‘거기’가 실재(實在)하는 그런 곳이라면 가슴 떨리는 일이다. 화자의 눈과 가슴으로 소설의 현장에 서 있을 수 있으니 말이다.
소설에서 스토리 전개상 장소 자체가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이순원의 소설에 등장하는 ‘은비령’이 그런 곳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소설이 발표되기 전까지 은비령은 있었지만(?) 없었다. 풀이하자면 그런 고개(구간)는 있었지만 지명은 없었다는 뜻이다. 굳이 도로명주소로 말하자면 인제군도인 ‘필례로’가 합법적인 이름이다. 한계령휴게소에서 양양 방향으로 500m 정도 내려오다 필례약수터 방향 오른쪽 샛길로 꺾어지면서 나오는 고갯길을 말한다.
무엇이든 알려주는 OO위키에는 가상의 고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틀린 말이다.
소설 속에도 은비령의 위치를 일러주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대로 가면 실제 그곳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럼 왜 은비령으로 이름 지었을까. 소설 속에서 화자가 지은 원래 이름은 은자령이었다.
하지만 은자(隱者)가 산야에 묻혀 숨어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같이 공부하게 된 친구(후에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되는 여자 선혜의 남편)가 생기면서 ‘은비령’으로 새롭게 고쳐서 작명하게 된다. ‘신비롭게 깊이 감춰진 땅’이라는 의미를 품었다고 하는데 한자로 풀자면 숨을 은(隱), 숨길 비(秘), 고개 령(嶺)이다. 스스로 숨고 누군가를 숨겨주는 고개, 그 안에 펼쳐지는 ‘은비팔경(이것도 소설 속 작명이다)’에 이르기까지 신비한 고개와 그 곳을 둘러치고 있는 절경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이상향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싶다.
그런 은비령은 남자주인공과 선혜의 만남처럼 현실 속에서는 이룰 수 없는 만남과 예고된 이별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윤회와 윤회를 거듭하다 다시 지금과 똑같은 상황을 만나려면 2,500만년이 지나야 한다는 소설 속 이야기는 그래서 오히려 담담한, 그래서 더 슬픈 양가의 감정으로 다가온다. 하룻밤을 지내고 어슴푸레 그녀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는 정말 담담했을까.
어쩌면 그날이 2,500만년 만에 다시 만난 첫 날 그리고 또 다른 영원의 시간을 시작하는 이별의 날은 아니었을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