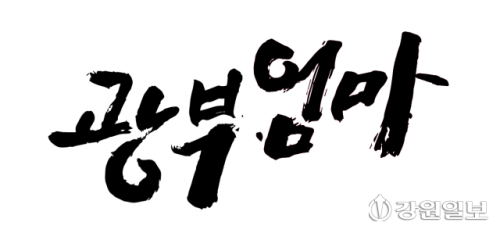탄광은 칠흑같이 어둡다. 지하 1,000m 막장은 말할 것도 없다. 오랫동안 탄가루가 쌓인 광업소의 흙바닥은 검은 땅으로 이뤄졌다. 수십여년의 산업화 과정에서 캐낸 석탄 경석이 쌓여 검은 산이 됐다. 분진을 뒤집어 쓴 광부의 얼굴에는 검은 땀이 흐른다.
가장 깊고 어두운 막장, 온통 검은 탄광촌을 빛으로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남긴 찰나의 빛은 폐광지의 역사가 된다.
지난 4월8일 오전, 태백에 도착한 강원일보 취재진은 일평생 탄광의 삶과 역사를 렌즈에 담아온 사진작가 박병문(65)씨를 만났다. 박 작가는 ‘광부엄마’ 특별보도를 준비하면서 취재진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었다.
그는 광부들과 함께 지하 막장에 직접 입갱해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석탄을 캐내는 광부들을 사진으로 남긴다. 그리고 10여년 전 부터는 여성광부 선탄부를 기록하는데 혼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뉴욕, 헝가리 등 세계 각국에서 여성광부의 삶을 기록한 사진전을 열기도 한다.
‘기록’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탄광의 역사를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남기는 일은 강원일보 기자들의 역할과도 닮아있었다. 평생을 탄광과 렌즈에 바친 그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박 작가는 광부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미 괭이 대신 카메라를 진 광부였다. 그의 사진은 탄광촌의 구성원이었던 스스로가 폐광지에 보내는 ‘헌사’였다.

■광부아들도 몰랐던 ‘탄광의 여성’=박 작가가 광부 프로젝트 7부작을 처음 기획한 것은 20여년 전이다. 광부의 아들인 그 조차도 여성광부 선탄부의 존재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당시 첫 프로젝트로 ‘아버지는 광부였다’를 제작 중이던 그는 탄광에서 온통 탄가루를 뒤집어 쓴 여성들을 처음 봤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들의 삶을 사진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씨는 “여성광부는 없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새카맣게 탄이 묻은 얼굴의 여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광업소 안전요원에게 정체를 물었다”며 “석탄과 돌, 경석을 골라내는 여성광부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광부의 아들로 한평생을 살았으면서도 선탄부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다는 데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용기를 내 선탄부를 찾아갔고 사진 촬영을 제안했지만 단칼에 거절 당했다. 3년을 찾아가 설득해도 선탄부들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다만 선탄부 대부분이 퇴사 후 진폐증 인정을 받지 못해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선탄부의 존재와 작업환경을 알려야 한다는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광부아들, 지상 막장에 들어서다=지상의 막장. 박병문 사진작가가 기록한 선탄장의 첫인상이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에게도 선탄부의 존재는 낯설었다.
막장이 금녀의 구역이라면 선탄장은 금남의 구역이었다. 집요하게 렌즈를 들이대는 남성 작가에게 달갑지 않은 시선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잿빛 분진으로 가득 찬 삶을 기록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날마다 짙어졌다. 삼척 경동탄광과 태백 장성탄광을 꼬박 3년간 오간 박병문 작가. 그의 진정성을 느낀 선탄부들은 어느덧 그와 조금씩 일상에 대한 대화를 나눴고 자연스럽게 서로 동화되며 한 컷 한 컷씩 사진을 남길 수 있게됐다.
박 작가는 “선탄부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게 촬영의 목표였다”며 “선탄장 일이 워낙 고되다 보니 촬영 허가를 구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했다”고 했다. 그는 “후세가 여성광부의 존재를 기억했으면 한다는 말에 선탄부들도 공감했고, 그 덕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촬영 비화를 밝혔다.
선탄부의 억척스러운 손길을 따라 셔터를 누르는 박 작가의 손길도 바빠졌다. ‘선탄부-어느 여자 광부의 하루’는 그의 광부 프로젝트 중 네번째 작품이 됐다.
■경외심을 부른 검은 땀방울=작업복에 몸을 숨기는 순간부터 박 작가는 선탄부의 하루를 끈질기게 쫓았다. 온몸을 뒤덮은 검은 분진과 땀을 씻어내는 장면까지 사진에 담았다. 가까이서 본 선탄부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고단했다. 앞이 안 보이는 분진 속에서 분주한 손길로 탄을 줍고, 굽은 허리로 연신 삽질을 했다. 온몸에 들러붙은 끈적한 탄가루에 마스크는 검게 변한 지 오래였다.
선탄장 풍경을 회상하던 박병문 작가는 “벨트 사이를 가르며 선탄장을 기록하는 일은 꽤나 벅찬 작업이었지만, 그들의 뒷모습에 베인 눅진한 삶의 향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고달픈 삶. 하지만 연민의 시선으로 그들을 기록하고 싶진 않았다. 지상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삶의 무게를 견디는 이들을 담담히 담아내고 싶었다. ‘선탄부-어느 여자 광부의 하루’는 광부였던 ‘아버지’와 아들인 ‘나’는 물론, 나와 함께 살아온 ‘당신’들에 대한 기록이었다.
박병문 작가는 “선탄장의 작업 환경은 여전히 매우 악조건이지만, 선탄부들은 자신의 일이 천직이라 생각하며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3년간 이들과 부대끼며 작업을 하다보니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로서 존경심과 유대감이 생겨났다”고 했다.
또 “사고로 남편을 잃은 선탄부들이 3교대를 견뎌내면서 밤에는 아이들과 함께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함께 놀아주지 못하는 고달픈 삶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엄마는 강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녀들의 노고 기억해야”=지난해 겨울 미국 뉴욕에 선탄부들의 얼굴이 걸렸다. 약 열흘 간 뉴욕 갈라 아트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연 박병문 작가. 그의 렌즈 안에서 선탄부는 더 이상 조연이 아니었다. 푸석한 분진 속 여성들의 삶은 한국을 넘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녀들의 잿빛 얼굴에서 누군가는 고달팠던 젊은 시절을, 누군가는 어머니의 빛 바랜 희생을 떠올렸다.
박 작가는 “여성 광부는 세계적으로도 흔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반응이 뜨거웠다”며 “특히 교민들이 전시장을 많이 찾았는데, 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우는 이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척박한 삶을 살아온 이들만이 느끼는 공감의 눈물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일보 취재진을 향해 “왜 이제야 왔냐며” 아쉬움을 드러내던 박병문 작가. 어느덧 그의 사진 속 선탄부 대부분이 탄광을 떠났다. 그럼에도 박 작가는 카메라를 놓지 않는다. 사진은 그녀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하는 박 작가만의 방식이다.
그는 “이제 선탄부를 기억하는 이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검은 땀을 흘리며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온 그녀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탄부는 광부 프로젝트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작업이었다”며 “모든 탄광이 문을 닫은 후에도 그들의 노고가 기억되길,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업장에 들어가면 분진이 말도 못하다. 3년을 따라다니며 직접 돌을 고르기도 했다”며 “(사진으로)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의료계, 법조계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선탄부 모습을 담은 사진작품들을 보게되면서 하나 둘씩 진폐인정을 받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