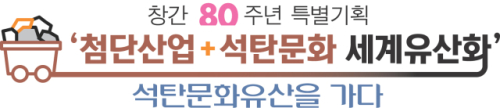삼척시 도계읍 영동선 폐선 철도변의 마을 어귀, 높이 8m의 마치 버섯을 닮은 이질적인 구조물이 눈에 띈다.
1940년 영동선 개통 당시 건립된 ‘급수탑’이다. 증기기관차는 다량의 물이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하다. 급수탑은 일정 거리마다 증기기관차에 물을 보충하는 역할을 했다. 1967년 국내에서 증기기관차가 퇴역한 후 급수탑은 대부분 사라졌고 이제 전국 19개만이 남아 있다.
강원 지역은 삼척 도계역 급수탑과 원주역 급수탑이 유이하게 보존되고 있다. 2003년 당시 문화재청은 도계역 급수탑을 근대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재 46호로 지정했다. 26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도계역 급수탑은 석탄을 가득 싣고 탄광과 동해안 항만을 오가는 화물열차, 광부와 학생, 상인, 여행객들이 탑승한 여객열차에 물을 보충해 줬다.
증기기관차는 도계역에서 반드시 쉬어야만 험준한 통리협곡을 넘어 태백 방면으로 갈 수 있었다.
도계와 태백의 경계인 통리역은 해발 680m로 삼척 도계역(245m) 보다 430m나 높다. 증기의 힘으로는 이 구간을 치고 오를 수 없다.
이로 인해 승객들이 모두 내려 고개를 걸어오르고 기관차와 객차를 분리해 한 량씩 쇠줄로 끌어올리는 인클라인 철도와 열차가 지그재그로 고개를 오르는 국내 유일의 스위치백(switchback) 철도가 있던 곳이다. 도계역 급수탑은 협곡을 오르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온 힘을 짜내는 곳이었다.
도계역에 멈춰 물을 보충하는 시간은 승객들에게는 색다른 즐거움이었다.
물 보충을 위해 열차가 정차한 30여분간 도계상인들은 승객들에 옥수수, 감자, 떡 등 주전부리를 팔았다. 오징어, 땅콩, 계란 등을 팔던 열차 카트가 디젤기관차의 추억이었다면 급수탑은 그 보다 이전 증기기관차의 상징 같았다.
급수탑 일원은 ‘까막동네’라고 불린다. 도계광업소와 담장을 맞대고 있다. 지금도 탄광마을의 전형을 그대로 갖춘 국내 몇 안 되는 곳이다.
정연수 탄전문화연구소장은 “도계역 급수탑은 국내 유일의 스위치백 구간을 오르기 위해 조성된 상징적인 시설이다. 열차가 도계역에서 잠시 쉬어가며 장터가 열리는 등 탄광의 독특한 스토리가 담긴 곳”이라고 말했다.